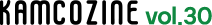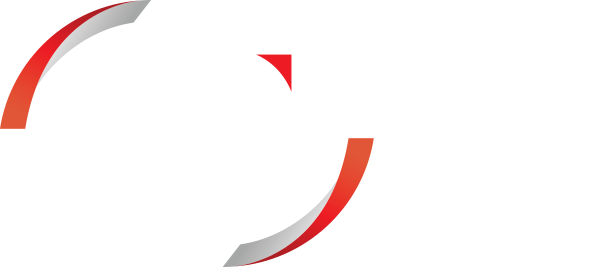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정답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정답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을 듯하다. 사람은 장기간 학교에 다니며 뭔가를 배운다. 이 배움을 통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답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현자의 말과 책 속의 지혜가 과연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전국시대 장자(莊子)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혜안을 찾고자 했다. 그는 삶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했을까? 장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기상천외한 우화(寓話)를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내놓는다. 그는 위의 물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수영을 잘하는 달인 이야기

장자는 우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지만 공자(孔子)를 내세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도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여량(呂梁) 지역을 여행하다가 폭포의 물이 사십 리가 흘러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폭포 아래에는 물고기라도 헤엄을 칠 수 없을 정도로 급류가 흘렀다.
그런데 공자가 폭포 가까이 가자 어떤 남성이 폭포 아래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공자는 그 사람이 위험한 폭포 아래에서 헤엄을 친다기보다 뭔가 세상살이가 힘겨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 생각했다. 이에 제자를 보내 혹시 남성이 잘못되지 않는지 물결을 따라가며 구해주라고 했다.
공자와 일행이 물길을 따라 내려가 보니 그 남성은 어느 틈에 물에서 나와 머리를 풀어헤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에 크게 놀란 공자는 “혹시 귀신일까?” 의심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영락없이 사람이었다. 공자는 호기심이 생겨서 급류가 흐르는 폭포 아래에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남성은 “도(道란) 평소에 늘 익숙한 것으로 시작하여 본성에 따라 나아가고 천명에 따라 이뤄지게 한다(시호고 始乎故, 장호성 長乎性, 성호명 成乎命).”라고 대답하고 다시 이를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솟는 물과 더불어 물 밖으로 나오며 물길을 따라가며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풀이했다.(「달생 達生」) 이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 있고 그것을 어기지 않고 따라가면 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정해진 길로서 정답이 있는 듯하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사이길

장자를 비롯해서 제자백가는 서가에 파묻혀서 책만을 읽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일구기 위해서나 자신의 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유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길을 떠났다. 장자도 친구 혜시(惠施)와 함께 강을 거닐기도 하고 제자들도 숲속을 거닐기도 했다.
장자가 제자와 숲속을 거닐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나무를 구경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장자 일행도 가까이 가서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뭇가지가 무성하여 하늘을 가릴 정도였지 줄기 곳곳에 옹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나무는 아주 크지만 쓸모가 없어서 사람이 구경할 뿐 목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쓸모없음의 쓸모(無用之用)”라고 할 수 있다.
날이 저물자 장자는 친구 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어가 보자 했다. 장자가 친구를 찾아가자 그이는 거위를 잡아 장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장자 친구에게 우는 거위와 울지 못하는 거위 중 어느 거위를 잡을지 물었다. 그러자 장자 친구는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아 요리하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장자 일행이 길을 떠날 때 제자가 장자에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했다. 나무의 경우 쓸모가 없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천수를 누릴 수 있지만 거위의 경우 쓸모가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 “무용지용”이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는 이야기였다. 장자는 제자의 질문을 듣고서 고민한 끝에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에 처하라(처호재여부재지간 處乎材與不材之間).”는 제안을 했다.(「산목 山木」)
얼핏 생각하면 장자의 대답이 궁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세상사를 흑백의 논리로 보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아니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사를 흑백의 논리를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에 바라보면 사정이 다르다. 흑백 논리에 따르면 ‘이것 아니면 저것’의 양자택일밖에 없다. 하지만 흑백 논리를 벗어나면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면 다른 가능성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생각나지도 않는다.
우리가 입시와 입찰 등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면 ‘성공 아니면 실패’의 흑백 논리로 바라본다. 성공하면 모든 걸 다 갖고 실패하면 모든 잃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이 몰락으로 이어지고 실패가 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즉 세상사는 흑백 논리의 일방향이 아니라 그를 벗어나서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면 더욱더 풍부해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대응하는 도의 길을 제시한다. 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편집증에서 벗어나 상상으로 세상을 다채롭게 바라보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길’을 찾아야겠다. 이 ‘사이길(之間)’을 찾다 보면 결국 도의 길도 찾을 수 있으리라. 사람이 가는 도의 길은 원래부터 있는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도행지이성 道行之而成)’이기 때문이다.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
서울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재직하며 동아시아 철학과 예술을 강의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통의 사상 자원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인문예술학회를 결성하여 인문학과 예술의 연결을 모색하는 신인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동양철학의 유혹, 사람다움의 발견, 철학사의 전환, 맹자의 꿈 등 다수가 있다.